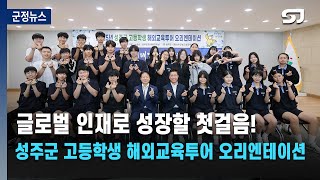more
 |
| ↑↑ 최 필 동 수필가 |
| ⓒ 성주신문 |
(1023호-사랑한 우리말(1)에서 이어집니다.)
'개치네쒜'는 재채기를 한 뒤에 외치는 소리인데, 감기 시초일 때 재채기하면서 '에취! 감기야 물러가라'고 하는 소릴 어린 시절 어른들로부터 많이 들었다. 큰 소리로 에취라고 외치면 감기가 물러간다는 미신적 속설의 관습이 있었는데 그게 '개치네쒜'가 변한 말이라 한다고 어디서 들은 얘기다.
'군입정'은 군음식으로 입맛을 다신다는 말인데 주전부리와 비슷한 말이다. 지금은 노년층이나 쓰니 언젠가는 사어(死語)가 될지도 모르겠다.
'골무'는 바느질 할 때 바늘을 누르기 위해 손가락 끝에 끼는 물건인데 속칭 '감투할미'라고도 한다. 어머니들의 필수품이었지만 지금은 어머니들도 쓰지 않는다. 세상 참 많이 변했다. 지난 시절 선비들에겐 문방사우가 있다면 여인네들에겐 규중칠우(閨中七友) 즉 자, 가위, 바늘, 실, 골무, 인두, 다리미가 있었다. 이 도구들을 의인화한 조선시대 '규중칠우쟁론기'에선 흥미롭게도 골무(감투할미)가 가장 어른스러운 좌장이었다 한다.
'구순하다'는 말썽없이 의좋게 잘 지낸다는 말인데, 모두들 잘 사는 세상은 왔다곤 하지만 재물 때문에 형제간에 송사가, 그것도 대재벌 가문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니, 내 어릴 적 어른들이 형제자매 사이에 의논이 '구순하다'라고 쓰는 것을 자주 봤다.
말에 짐을 싣기 위해서는 말안장이 있듯이 소에는 짐을 싣기 위한 장구를 '길마'라 한다. 질마 또는 질매는 사투리이다. 시인 서정주의 '질마재'라는 시어도 있다.
해산물 '고등어'는 한자로 高等魚(고등어)라고 한다는데 틀린 표기라 한다. 등이 부풀어 올랐다고 해서 皐登魚(고등어)가 맞는 표기라 한다. 정약전의 자산어보에서 푸른무늬물고기라는 뜻의 碧紋魚(벽문어)라 썼다 한다.
배불리 먹을 것이 없을 시절 '수제비'는 우리 전통음식 이름인데, 手(수)와 접는다는 의미의 '접'이 합쳐진 '수접이'가 변하여 수제비가 됐다 한다.
'어부바'는 말을 알아듣기 시작한 젖먹이가 업어달라는 뜻으로 하는 말인데 '부바!'라는 준말도 썼다. 다산일 때의 우리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이 썼던 말이지만 지금은 좀체 들을 수가 없다.
'호주머니'는 조끼, 저고리, 바지 등에 꿰매어 단 주머니인데, 이 '호'자가 오랑캐 호자라 하고, 병자호란 때 조선이 당한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로 인한 새로운 말이 생겨났다 한다. 또 호래자식, 호녀(胡女), 호두나무 열매의 호도(胡桃) 등이 있다.
'끌신'은 베틀신이라고도 하는데 명주, 무명, 삼베 등 옷감을 짜는 베틀에 딸린 도구를 말한다. 우리 민족과 함께 해왔고 서민의 애환이 서린 '베틀노래'도 있다.
'도루묵'은 양도루묵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인데 원래 이름은 목어(木魚)였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피난길에서 처음 먹어보고 별미여서 은어(銀魚)라 격상시켜 줬는데, 대궐로 돌아온 선조가 그 맛이 생각나 다시 들여와 수랏상에 올렸는데, 그때 그 맛이 나지 않아 '도로 목어'라 하라 했다 해서 '도로목'이 되고 그게 변한 말이 '도루묵'이 됐다 한다.
'독장수 셈'은 옛날 독장수가 독을 덮어쓰고 길에서 자다가 꿈에 큰 부자가 되어 좋아서 뛰는 바람에 꿈을 깨고 보니 그만 독이 깨졌다는 얘기에서 온 말로, 쓸데없이 치는 셈이나 '헛수고의 셈'은 애만 쓴다는 뜻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다. '덩더꿍 소출'은 먹고 살아갈 일정한 재산이 없는 사람이 돈이 생기면 푼푼하게 쓰고, 없으면 어렵게 지냄을 비유한 말이다.
'돋을 볕'은 해가 돋아오를 때의 햇볕을 말하고, '땅거미'는 해가 진 뒤 컴컴하기 전까지 어슴푸레하다는 말인데, 원래 해가 지면 땅이 검어진다는 뜻의 '땅껌'이에서 땅거미로 변했다 한다.
'비누'의 어원은 '비루(飛陋·지저분한 것을 날려 보낸다)'에서 왔다고 하지만 근거가 없다 한다. 우리나라에 처음 비누가 들어온 것은 1653년 제주도에 표류해온 하멜에 의해서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라 한다. 어릴 때 어른들이 비누를 사분(沙粉)이라고 했지만 불어로는 savon(사봉)이라 한다니, 그때 어른들은 불어임을 알고 썼을까…?
'불가사리'는 '죽일 수 없다'라는 뜻의 불가살이(不可殺伊)에서 유래한 말이며, 쇠를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다는 상상 속의 동물이다. '말살에 쇠살'은 푸줏간에 쇠고기를 사러 갔는데 말고기를 내놓고 우기는 상황에서 비롯된 말이며, 전혀 사리에 맞지 않음의 비유로 쓰인다.
'실랑이질'은 옳으니 그르니하여 남을 못 견디게 굴어 시달리게 하는 짓을 말한다. 원래 이 말은, 과거에 새로 급제한 사람을 선배들이 축하한다는 의미로 얼굴에 먹으로 앙괭이(귀신 형상)를 그리곤 이래라 저래라 귀찮게 한다는 말의 신래위(新來爲)가 변하여 실랑이질이 됐다 한다.
'상두받잇집'은 지나가는 상여가 그 집 대문을 정면으로 마주친 뒤에야 돌아간다는 집을 이르는 말이다. 유사한 얘기는 1960년대의 영화 '황진이'가 있다. 송도삼절로 통칭되는 그가 열대여섯 살이나 됐을 때 동네 숫총각이 자기를 연모하다 상사병으로 죽었는데, 그 상여가 황진이 집 앞을 지나다 멈춰섰다. 상두꾼이 밀고 당겨도 꿈쩍 않는 걸 본 황진이가 상여를 향해 절을 하니 그때야 상여가 움직였다는 것 말이다.
'색대'는 섬이나 가마니 속에 든 곡식이나 소금 따위를 찔러서 빼내어 보는 데 쓰는 도구인데 광복 후 벼 현물세를 납부할 때 썼다.
역사가 숨쉬는, 살아 있는 못다 한 많은 우리말 다음으로 미룬다.
(끝)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홈
홈